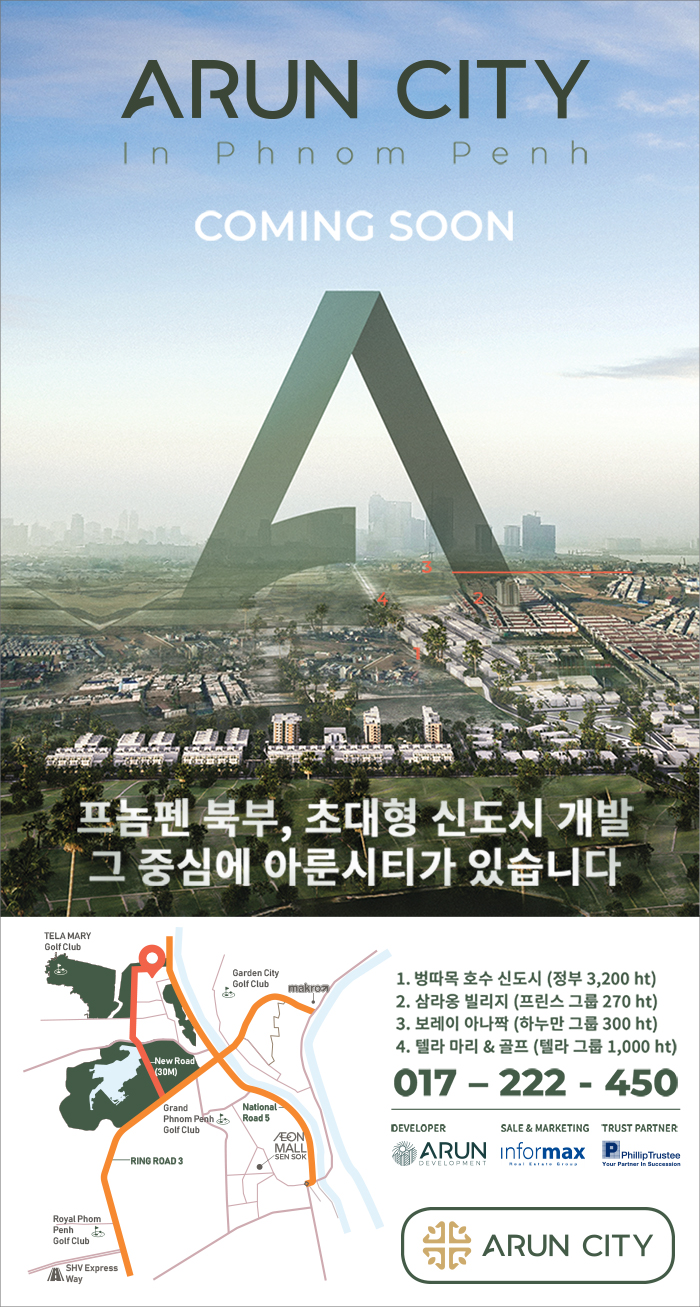- 캄보디아 의료 지원을 위해 더 많은 의사 필요Posted 1081 days ago
- 태국 국경 개방과 동시에 통행증 신청 쇄도Posted 1081 days ago
-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수 제로를 향하여 5월1일 단 2건에 그쳐Posted 1082 days ago
- 캄보디아-베트남 국경 인접 7개주 도로망 건설Posted 1082 days ago
- 5월 초 집중호우·홍수경보Posted 1082 days ago
- 캄보디아-베트남 돼지고기 밀수 단속 강화Posted 1082 days ago
- 미국, 캄보디아에 코로나19 백신 200만 회분 기부Posted 1082 days ago
- 캄보디아 2022 경제 성장률 5.4%로 하향 조정Posted 1082 days ago
- 캄보디아 학교 폭력, 금품 갈취는 기본, 교사 폭행 등 심각Posted 1082 days ago
- 캄보디아, 우기 오기도 전에 폭우로 6명 사망, 재산 피해 수백Posted 1082 days ago
[나순 칼럼] 설레는 출산을 위해
우리는 베이비붐 끄트머리 세대다. 세상에 나오자마자 산아제한 정책이 시작되었으니 천덕꾸러기(?)인 셈이다. 국민 학교 다닐 때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 “무턱대고 낳다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 현수막이 거리 여기저기에 붙어있었다. 아들을 바라던 부모님 덕분에 동기간이 9남매인 친구가 있었는데, 직계 삼대만 오십 명에 이르러 명절 때면 혼잡을 피하기 위해 홀짝으로 모인다고 했다.(첫째 셋째… 가족이 둘째 넷째…가족을 영원히 그리워했다나.) 당시 출산억제 정책은 필사적이어서 남자가 정관수술을 하면 예비군훈련을 면제해 주기도 하고, 하늘에 별따기였던 아파트 특별 분양 혜택까지 주어졌다. 그때 읽은 단편소설 중, 아파트 분양권에 눈이 멀어 정관수술을 한 가장들을 풍자한 얘기가 있다. 끝까지 신조를 지켜 생식력은 보존했으나 편법으로 아파트를 분양 받아 심리적 갈등을 느끼는 사나이가 주인공이다. 어느 날 퇴근길에 술이 거나해서 그 특혜분양 아파트 단지를 쏘아보며 외친다. “야, 씨도 없는 놈들아!”
격세지감으로 인공수정시술을 무상지원해주는 다산장려 시대로 바뀌었지만, 다양한 출산 인센티브에도 불구하고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2014 보건복지통계연보에 따르면, 작년 우리나라 출산율이 1.19명으로 2009년 이후 4년 만에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캄보디아도 1990년대 내전을 치른 뒤 베이비붐 세대를 거쳐 4.82명이던 출산율이 2012년 2.78명까지 떨어졌다. 프놈펜 서민으로부터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생활을 꾸려가기 힘들어 출산을 단념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심심찮게 듣는다. 다산도 부유층에서나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된 셈이다. 21세기 들어 인구증가율감소는 세계적인 추세로 이런 자발적인 무자녀 현상은 정치, 경제, 가치관에 대한 복잡한 국민심리의 반영일 터이다. 잘 살면서도 높은 출산율을 유지하는 북유럽의 예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출산율을 높이는데 새로운 세대에 대한 낙관적인 믿음을 주는 사회안전망 구축이 가장 큰 관건이다.
형제자매가 평균 5, 6명이었던 베이비 붐 시대엔 다들 고만고만하게 살아 상대적 빈곤감 따위는 없었다. 그들이 할아버지가 되었을 즈음부터, “자식교육엔 할아버지 재력이 필수”라는 말이 유행했다. 재능이나 노력보다 조상을 잘 만나야 출세한다는 인식이 팽배할 정도로 경제성장과 더불어 부의 편중이 심해졌다는 반증이다. 토마 피케티는 그의 저서 <21세기 자본>에, 인구감소는 상속자본의 영향력 증대로 이어져 부의 심각한 불평등을 야기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라고 썼다. 다자녀 사회에서는 상속분이 미미해 스스로 재산을 일궈야하므로 차등이 덜하겠지만, 한 자녀일 경우 부모의 재정상태가 그대로 대물림 되어 부익부 빈익빈이 더욱 심화된다는 의미일 테다. 아등바등한 삶이 자식 대에까지 이어질 게 절실히 체감되는 시스템에서 언 발에 오줌 누기 식 정책이 실효를 거둘 리 만무하다. 분배와 복지 등, 불평등 감소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 없이 마음 설레는 출산을 기대하기 힘들 듯싶다. / 나순(건축사, 메종루비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