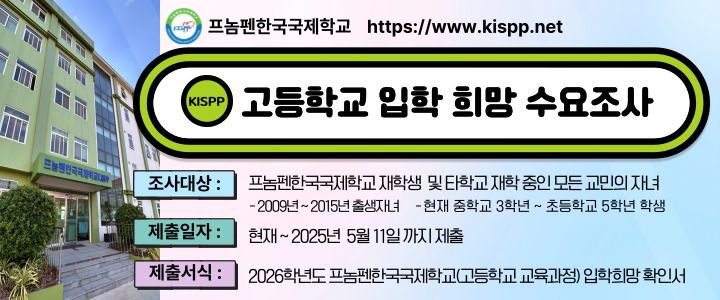- 캄보디아 의료 지원을 위해 더 많은 의사 필요Posted 1099 days ago
- 태국 국경 개방과 동시에 통행증 신청 쇄도Posted 1099 days ago
-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수 제로를 향하여 5월1일 단 2건에 그쳐Posted 1100 days ago
- 캄보디아-베트남 국경 인접 7개주 도로망 건설Posted 1100 days ago
- 5월 초 집중호우·홍수경보Posted 1100 days ago
- 캄보디아-베트남 돼지고기 밀수 단속 강화Posted 1100 days ago
- 미국, 캄보디아에 코로나19 백신 200만 회분 기부Posted 1100 days ago
- 캄보디아 2022 경제 성장률 5.4%로 하향 조정Posted 1100 days ago
- 캄보디아 학교 폭력, 금품 갈취는 기본, 교사 폭행 등 심각Posted 1100 days ago
- 캄보디아, 우기 오기도 전에 폭우로 6명 사망, 재산 피해 수백Posted 1100 days ago
[한강우칼럼] 소녀들의 용기와 꿈
네 명의 KOICA 드림봉사단 단원들과 함께 일일 봉사 활동에 참여했다. 깨이고 망가져서 포장도로라 할 수도 없는 시멘트 길을 달려 찾아간 영세민촌, 행정구역상으로는 프놈펜이지만 영락없는 시골 마을 분위기가 풍기는 변방 한쪽에 급식소가 차려져 있었다. 함석을 얹어 식사할 때 햇볕은 피할 수 있도록 만든 휑한 공간 한쪽에 조리실이 갖추어져 있었다. 다일공동체가 운영하는 ‘밥퍼’의 프놈펜 센터였다.
도착하자마자 담당 간사의 급식소 현황 소개와 수행할 일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들은 후 단원 네 명은 앞치마를 두르고 곧장 작업에 들어갔다. 점심 메뉴로 정한 볶음밥을 만들기 위해서 미리 준비된 야채를 씻고 다듬고 써는 일부터 시작했다. 약 400여 명의 식사를 준비하는 데 다일공동체 정규 인력은 네 명뿐, 그들을 보조하는 일이지만 네 명의 KOICA 드림봉사단 단원들의 역할이 무척 크고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채칼에 생채기가 나고 건기 절정의 더위에 땀으로 온몸이 범벅이 되면서도 자기 맡은 일에 열중하는 어린 단원들이 대견스러웠다.
11시가 넘자 아이들이 꾸역꾸역 모여들었다. 너댓 살 꼬맹이부터 열서너 살 어린이까지 배식대를 향해 금세 기다란 줄이 만들어지고 일대가 아이들 재잘거림으로 뒤덮였다. 점심 한 끼를 위하여 한 걸음에 내달려온 가난한 아이들, 식판을 받아든 아이들의 눈망울이 초롱초롱 빛났다. 후딱 한 그릇을 비우고 다시 식판을 내미는 아이들까지 정성껏 음식을 챙겨주는 단원들의 손길에서 사랑이 묻어났다. 대열에서 밀려나 울음을 터뜨리는 아이를 안아 달래 주는 광경은 참 아름답게 보였다.
단원 네 명의 평균 나이가 채 스무 살이 되지 않는 앳된 소녀들, ‘KOICA 드림 봉사단’이라는 이름을 달고 캄보디아에 온 이들을 보고 처음에는 걱정이 됐었다. 그 또래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부모에게 기대서 사는 한국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아직 사회생활을 해 보지 못한 이들이 어떻게 오지 봉사를 수행해 낼 수 있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었다. 그런데, 불과 서너 시간이지만 몸을 던져 봉사활동을 수행하는 그들을 지켜보며 처음 가졌던 걱정이 말끔히 사라졌다. 그리고, 대학이나 사회로 나가기 전에 해외 봉사를 선택한 그들의 용기와 꿈이 가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 한강우 한국어전문학교 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