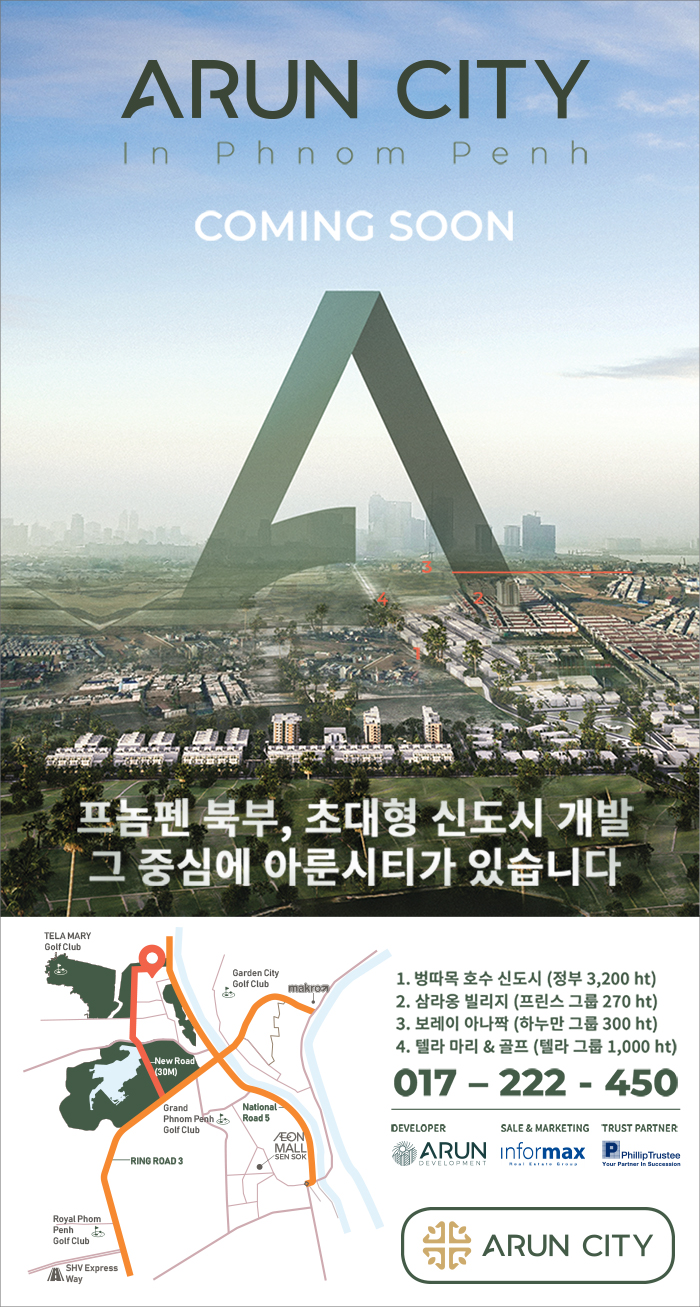- 캄보디아 의료 지원을 위해 더 많은 의사 필요Posted 1081 days ago
- 태국 국경 개방과 동시에 통행증 신청 쇄도Posted 1081 days ago
-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수 제로를 향하여 5월1일 단 2건에 그쳐Posted 1082 days ago
- 캄보디아-베트남 국경 인접 7개주 도로망 건설Posted 1082 days ago
- 5월 초 집중호우·홍수경보Posted 1082 days ago
- 캄보디아-베트남 돼지고기 밀수 단속 강화Posted 1082 days ago
- 미국, 캄보디아에 코로나19 백신 200만 회분 기부Posted 1082 days ago
- 캄보디아 2022 경제 성장률 5.4%로 하향 조정Posted 1082 days ago
- 캄보디아 학교 폭력, 금품 갈취는 기본, 교사 폭행 등 심각Posted 1082 days ago
- 캄보디아, 우기 오기도 전에 폭우로 6명 사망, 재산 피해 수백Posted 1082 days ago
[나순칼럼] 넉넉한 한가위의 사랑
프놈펜의 밤이 깊어가고 있다. 무심코 베란다로 나서보니 어릴 적 막연한 슬픔을 안겨줬던 그 밤하늘처럼 별들이 초롱초롱하다. 별 하나하나의 이름은 잊은 지 오래나, 인디언 혈통의 작가 ‘포리스트 카터’의 자전적 소설 <내 영혼이 따뜻했던 날들>의 ‘늑대별’이 떠오른다. ‘시리우스’의 인디언식 이름으로 겨울하늘에 가장 밝게 빛나는 별이다. 인디언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갑자기 고아가 된 예닐곱 살의 손자를 보살피며 평화롭게 살아가는데, 정부 측으로부터 양육 부적격 판결을 받고 생이별을 하게 된다. 손자가 고아원으로 끌려가게 되던 날 할머니가 손자에게 이른다. “어디에 있든 저녁 어둠이 깔릴 무렵이면 꼭 늑대별을 처다 보도록 해라, 할아버지와 나도 그 별을 볼 테니까.” 땅거미만 지면 세 사람은 늑대별을 바라보며 서로를 걱정하는 마음과 옛 추억, 앞으로의 소망 등의 메시지를 보낸다. 현대인이 적절한 시간에 각지에 흩어져 사는 가족과 모바일 메신저(카카오톡)에서 만나는 거나 별반 다를 바 없다. 요즘 우리는 문자나 음성, 사진 같이 눈에 보이는 것을 교환하고 옛날 그들은 오로지 텔레파시에 의지해 소통했겠지만, 어느 편의 감응이 더 깊을지 선뜻 가늠하기 힘들다.
여태껏 살아오면서 가장 행복했던 때는 첫아이를 낳았던 때와 시댁으로부터 분가했던 때다. 처음으로 부모가 되면서 ‘내가 한 짓 맞나?’ 남모르는 기적이라도 체험한 듯 기뻐했고 부모님을 배신(?)하면서 마침내 독립을 쟁취한 우국지사처럼 뿌듯해 했으니,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자진해서 하는 일은 고통조차도 행복하다더니, 시모시하 마지못해 하던 가사 일이 그렇게 감칠맛 날 수가 없었다. 특히나 명절증후군에서 해방된 기쁨이란. 시어머니께서는 명절이 다가오면 달포쯤 전부터 분주해지셨다. 대청소에 커튼이며 이부자리를 단속하는 것을 시작으로 남대문시장으로, 경동시장으로, 마장동시장으로, 제수거리를 가장 알뜰하게 장만할 수 있는 일정에 맞춰 장을 보러 다니셨다. 세월이 한참 지난 후에야 불편하신 노구에 어머님이 더 힘 드셨겠구나 싶어지던 게, 사랑은 내리사랑이지 나같이 수양이 더딘 사람에게 치사랑은 어림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인디언 언어로 ‘사랑’과 ‘이해’는 같은 말(kin)이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사랑할 수 없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이다. 원래 ‘친척(kinfolks)’이라는 말도 ‘사랑하는 사람’, ‘이해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누구라도 사랑(이해)하는 사람끼리는 친척이라 칭했는데, 갈수록 사람들이 이기적으로 변해 단지 혈연관계에 있는 사람을 뜻하는 말로 바뀌었다고 한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사랑이 넘쳐나고 친척의 범주도 점점 단출해지는 추세다. 그래도 한가위라서 그런가, 밤하늘을 올려다보니 문득 누군가 나를 생각하고 있을 것 같은 느낌이다. 나도 그리운 얼굴들을 떠올려 본다. 그 사람과 이 사람이 일치하지 않으면 어떤가. 혼자만의 사랑과 이해로도 넉넉하리라. 한가위가 아닌가! / 나순 (건축사, http://blog.naver.com/naar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