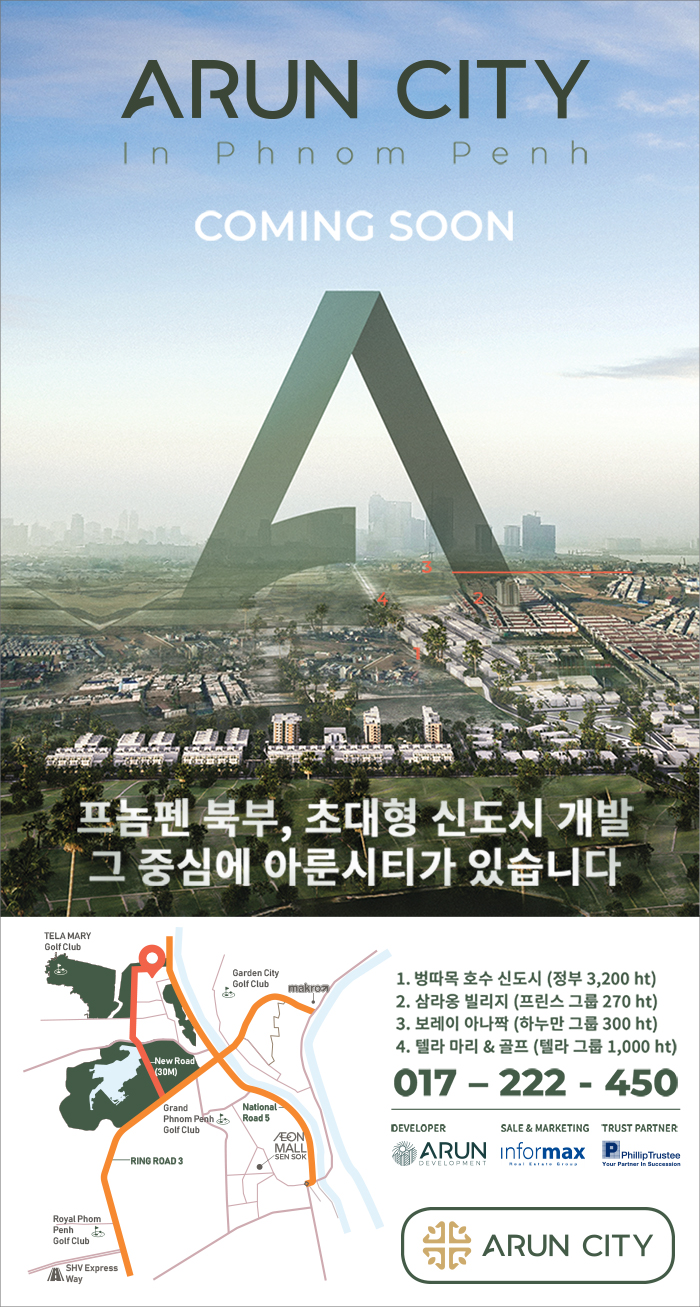- 캄보디아 의료 지원을 위해 더 많은 의사 필요Posted 1082 days ago
- 태국 국경 개방과 동시에 통행증 신청 쇄도Posted 1082 days ago
-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수 제로를 향하여 5월1일 단 2건에 그쳐Posted 1083 days ago
- 캄보디아-베트남 국경 인접 7개주 도로망 건설Posted 1083 days ago
- 5월 초 집중호우·홍수경보Posted 1083 days ago
- 캄보디아-베트남 돼지고기 밀수 단속 강화Posted 1083 days ago
- 미국, 캄보디아에 코로나19 백신 200만 회분 기부Posted 1083 days ago
- 캄보디아 2022 경제 성장률 5.4%로 하향 조정Posted 1083 days ago
- 캄보디아 학교 폭력, 금품 갈취는 기본, 교사 폭행 등 심각Posted 1083 days ago
- 캄보디아, 우기 오기도 전에 폭우로 6명 사망, 재산 피해 수백Posted 1083 days ago
[유일이 보는 세상] 꽃보다 아름다울 의무
건기 접어든 프놈펜의 12월 6일 토요일 밤 법의 바퀴 구르자 때 아닌 비가 쏟아졌다.
한국인이 가장 즐겨 듣는 클래식 음악을 조사하면 ‘사계’가 거의 언제나 첫 손 꼽힌다. 방향 틀어 책으로 가면 ‘어린 왕자’가 윗 순위에 자리 잡길 즐긴다. ‘순수’를 주제라고 읽은 그 작품이 정글 닮은 한국적 상황에서 왕자처럼 대접 받는 일은 이채롭다.
프놈펜 왕립대학에는 군데군데 연못이 많다. 코이카가 지어준 CKCC(Cambodia Korea Cooperation Center) 앞에도 조그만 연못 앉았는데 한 가운데 초록의 길이 예쁘게 나 있었다. 독특한 조경 안목에 감탄하며 걸음을 옮기다 아뿔싸 그만 텀벙 빠지고 말았으니 길처럼 보인 건 무수히 뜬 미세 풀잎들의 모둠이었다.
눈이 보배라 해가 지날수록 시나브로 약해지는 시력 탓이었던 게다. 그래도 그렇지 우둔하게 세 걸음이나 떼고 나서야 길 아닌 걸 알았다. 좋게 보면 세상에 대한 믿음이 커서라 하겠으나 그보다는 상황을 살피는 주의력이 현상과 어긋난 것이라 보는 게 적절하겠다.
시원하게 적신 발로 대학 캠퍼스를 느긋하게 걷자니 역시 유별나게 눈에 띄는 건 입가에 물린 학생들의 미소였다. 언제 봐도 아름다운 캄보디아의 경쟁력이라는 생각 지울 수 없다. 그러다 문득 그 미소에 대해 상당한 신경질 담아 비판하던 어떤 얼굴이 떠올랐다.
그는 일본 유학을 다녀온 캄보디아에 드문 지성인이었다. 그런데 소위 말하는 빽과 끈이 없으면 미관말직(微官末職)을 전전하는 안타까운 캄보디아 현실을 보여준 사람이기도 했다. 그는 자기 나라 사람들의 미소를 착한 성품보다는 눈치 담긴 비굴함으로 해석하며 언짢아했었다.
웃음에 얹힌, 엔지오의 활동이나 해외 원조에 지나치게 의존하려는 국민 성향 읽을 때 그의 지적은 일견(一見) 타당성 있게 느껴졌다. 외국인 투자 회사에서 현지인 중견 간부를 키우려 할라치면 당연히 일이 평소보다 어려워지는데, 그러면 돈 더 받는 것도 싫다며 손사래 친다는 얘기를 듣기도 했다. 일테면 손에 코 묻히는 일 싫으니 미소 머금어 때우고 말겠다는 심산(心算) 보인다는 게다.
물론 세상은 그리 바쁘게 돌아가야 하는 전쟁터만은 아니다. 나 또한 게으름 주무기 삼아 느린 삶의 아름다움을 부르대는 족속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캄보디아적 삶은 그에 아주 가까워서 지구적 차원의 조바심에 비하면 본받아야 할 롤모델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렇더라도 인간 또한 생물체인 이상 먹고 살아야 하며 그 조건이 노동임은 부인할 수 없다. 길 가의 꽃 한 송이나 날아가는 참새 한 마리도 제 밥은 제가 번다는 말씀이다. 예쁜 웃음 더없이 아름답지만 노동 거세된 것이라면 뿌리 없는 부초만도 못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굳이 백장 선사의 ‘무노동 무음식’까지를 들먹이자는 건 아니지만 ‘웃음 의존증’ 해석까지 나오는 판이라면 이는 간과할 수 없다. 가뜩이나 인접 베트남보다 현저하게 뒤지는 노동생산성이 언급되는 마당이니 말이다. 우스개 아니라 ‘웃기만 하는 자 먹지도 말라’ 외치는 지도자 나와야 하는 지도 모르는 일이다.
입 쩍 벌어지는 가격표 붙은 난초든 길가에서 손 흔드는 잡초든 활짝 핀 꽃 만나는 일은 언제나 신비롭다. 정교한 형식 갖추고 세상을 호흡하는 모습 보노라면 예경(禮敬)하는 마음이 은근히 솟구친다. 그러며 생각 드는 건 기왕에 태어난 존재로서 인간 역시 최소한 저 꽃들처럼 힘껏 살아야 한다는 각성이다.
값의 고하와 크기의 대소를 떠나 피어난 모든 꽃들은 아름답다. 그렇다면 정치적 위상 어떠하든 경제적 벌이 얼마든 태어난 인간 모두는 꽃들만큼은 아름다워야 하지 않을까. 저들이 온 생령 다해 꽃 피워내듯 우리 인간도 최선으로 사람다움 발현해야 되는 건 아닐까.
우리에게 그런 노력의 장식 없다면 감히 인간은 꽃보다 아름다울 수 없다. 전신으로 돋우어 피워낸 그들 꽃은 자립 잃고 누군가에게 기대려는 인간들보다는 ‘누가 뭐래도’ 아름답다. 치열하게 생존을 경쟁하되 학연, 지연, 종교연 없는 그들 보자면 더욱 그러함 느낀다.
한 승려가 꽃에게 묻는다.
“예쁜 꽃아! 너의 종교는 뭐니?”
꽃은 무어라 대답했을까.
우리가 꽃을 볼 때 향기 맡고 생김을 완상(玩賞)하되 종교 묻거나 출신지 따지지 않는다. 그러니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을 만날 때도 인간성의 빛과 향기를 먼저 맛보는 게 순서일 것 같다. 그게 온 국민 ‘어린 왕자’ 즐겨 읽는 나라답다고 나는 믿는다.
윤리 시간 통해 우리에게 지행합일(知行合一) 알려준 왕양명이라면 ‘어린 왕자 읽기’는 ‘어린 왕자 살기’로 이어져야 한다고 지적할 것 같다. 아마도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위상 담은 명함을 건네고 누구와의 연줄을 은근히 내세우는 건 천박하다고 말할 것이다. 대신 다음처럼 질문하라고 권할 듯하다.
“혹시 사막여우 좋아하세요?”
앞의 승려도 나아가 독자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다. 순수한 성정(性情)으로 서로의 어깨를 겯고 정직하게 삽질하고 정확하게 분배의 칼질하는 지구마을 되었으면 좋겠다. 편견 없는 모두가 어울려 진리의 바퀴가 아름답게 구르는 세상 땀 흘려 만든다면 정말 좋겠다.
한유일(교사) shiningday1@naver.com